
한국은 매우 열정적이면서 특별한 시장이다. 시장규모가 작고 원천기술은 부족하며 규제가 많아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기에 알맞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 전자와 LG 전자가 있으며 웹서비스가 일찍부터 발달했다. 해외에서는 한국을 오래전부터 '무선의 강국'으로 인지하고 있다.
한국은 '인프라'가 성장을 견인했다고 할 수 있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 인프라와 마케팅의 투자에 대해 선택과 집중이 용이하다. 새로운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테스트 베드가 한국처럼 적당한 곳은 많지 않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여 신규 인프라를 구축하면 적정 수준의 컨텐츠의 소비와 유통이 형성되고 사용자 반응을 쉽게 얻어낼 수 있다.
3G, LTE, Wibro 등과 같은 무선 인프라도 매우 빨리 구축되고 있지만 스마트폰 시장은 다소 늦게 시작되었다. iPhone이 국내에 진출하기 전까지의 WIPI 탑재 의무화의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2009년 11월 28일에 아이폰이 정식발매가 되면서 '스마트폰 혁명'이 시작되었다.

아이폰 출시 이후 국내 스마트폰은 비약적인 성장을 하여 10월 28일을 기준으로 2천만명 규모가 되었다. 지난 7월 11일, 가입자 천오백만명을 돌파한지 약 3.5개월만에 이루어낸 성장세이다. 2천만명이라는 수치는 전체 인구의 40%, 경제활동 인구의 80%에 해당한다. 인프라를 넘어서서 서비스 시장의 규모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환경적인 변화는 웹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이버는 PC 대비 모바일 UV 비중이 2010년 4분기 30%, 2011년 1분기 40%를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Daum은 2011년 2분기의 모바일 UV 비중이 전체의 50%를 기록했다. 싸이월드도 8월 기준으로 싸이월드 이용자 중 51%가 모바일을 통해 접속하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서비스 성격에 따라서 PC Traffic을 Mobile Traffic이 추월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Daum의 여성 서비스 '미즈넷'이 대표적이다. 미즈넷 모바일웹은 내부 지표 기준으로 8월 마지막주 PC웹 PV를 처음으로 추월하였고 10월 첫째주에는 PC웹보다 약 45%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웹서비스를 PC가 아닌 모바일 중심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모바일 환경에 서비스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2010년은 PC웹에 있는 서비스를 모바일로 잘 옮겨오기 위한 고민이 주로 이루어졌다. PC웹 서비스를 기능별로 구분하고 모바일에서 사용빈도가 높을만한 것을 선택하였다. 선별된 서비스와 요소들은 Mobile Web이나 Mobile App으로 만들어졌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서비스들이 포탈의 Mobile Web, Daum 지도, tv팟 등이다

서비스 사업자들은 PC웹을 모바일로 그대로 옮겨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다. 2011년이 되면서 모바일만의 특징(GPS, 카메라, 자이로 센서, 나침반, Push Notification 등)을 활용한 서비스들이 탄생하기 시작하였다. AR, 음성인식, 음악검색, 사물검색, 서울버스, 카카오톡 등과 같은 서비스들이 바로 그들이다. iPhone4S의 Siri가 발표되면서 이러한 시도들은 정점에 이르고 있다.
사업자들의 다양한 시도들과 업계의 호평과는 달리 일반 사용자들의 반응은 크지 않았다. Wow Impact는 있었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짧았던 것이다. 이러한 시도들이 '실패'했다고 평가하기보다는 사용자들이 적응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 있다.

2012년에는 어떠한 변화와 시도들이 이루어 질 것인가? 먼저, 모바일을 통한 수익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모바일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와 연구'의 개념이었다. 하지만, 시장 규모가 형성된만큼 다양한 BM에 대한 시도들이 이루어 질 것이다.
이미 네이버는 모바일 검색만으로 하루 7천만원의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 Daum의 AD@m은 일 3억 PV를 발생하고 있다. 광고 이외에도 모바일 커머스, 컨텐츠 직접 판매, 부분 유료화 등이 활발하게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본격적인 비즈니스의 시작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생겼다.

2009년까지는 PC만을, 2011년까지는 PC와 스마트폰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고민했었다. 그런데 Smart TV, Car Navigation, PMP, Smart Pad, Digital Sinage, Smart Watch 등과 같은 대응단말이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단말들을 Connected Device 라고 한다.
시장조사업체 IMS Research 보고서에 의하면 Connected Device는 현재 50억대로 추정하고 있다.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가 약 10억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5대 중 한대의 단말은 비컴퓨터 계열의 Connected Device라는 것이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10년 후에는 인터넷 연결 가능한 단말 수가 500억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2년부터는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개발할 때 이렇게 N-Screen 환경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N-Screen 관련 키워드를 보면 여러 단말에서 동일한 컨텐츠를 끊김없이 볼 수 있는 'Seamless'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Ubiqutous'가 핵심이다. 이제는 식상한 이들이 다시 언급되는 것은 'N-Screen'을 과거 AT&T 의 '3-Screen'의 연장선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사실 AT&T의 3-Screen 전략의 발상은 획기적이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때와 달리 지금은 모바일이 중심이며 4G와 같이 네트워크 속도가 빨라졌다. 그리고 Seamless와 Ubiqutous를 뒷받침할 기반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바로 'Cloud'가 그것이다. Cloud는 다양한 환경에 대응 하면서 데이터들이 동기화 될 수 있게끔 도와준다.

하지만 'N-Screen'이 '3-Screen'의 확장개념에서만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쯤에서 2012년 또 하나의 핵심 키워드인 'Smart TV' 이야기를 해보자. Smart TV는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Cloud를 통해 개인화된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다. 만약 Smart TV의 기능의 전부가 그렇다면 PC와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보급율이 증가하고 있는 환경에서 Smart TV를 구매할 니즈가 과연 얼마나 될까?
개인적으로 줄기차게 주장하는 미래의 키워드는 'Screen Interaction'이다. 동일한 컨텐츠, 동일한 서비스, 동일한 기능, 동일한 UX를 다양한 Screen에서 접속하는 것을 넘어서서 Screen간에 상호 반응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개인이 보유한 Screen이 증가하면서 컨텐츠를 소비하는 패턴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를 소비하는 사용자들이 Multi Tasking을 하는 것이다. Yahoo 조사에 의하면 86%의 응답자는 TV 시청 중 Mobile Internet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Screen Interaction'은 'Media Interaction'으로 발전하고 있다. TV의 '나는 가수다'에서 가수들이 노래를 부른다. 가수들과 주요 이슈들은 Daum, 네이버 등에서 실시간 이슈 검색어로 노출된다. 가수들이 불렀던 곡들은 온라인 음원 차트의 상위랭킹을 차지한다. SNS에서 사용자들은 관련하여 포스팅을 하고 신문사들과 TV 프로그램은 이러한 온라인의 반응을 기사화한다. 이렇게 정통적인 매스미디어와 온라인 미디어가 상호 반응하는 것은 이제는 매우 일반화되어 있다.
25%의 사용자는 지인들의 TV 시청 목록을 보고 싶어한다. 29%의 사용자는 TV를 시청하면서 Twitter를 사용하고 있다. 2010년 동계 올림픽 경기 때는 1/3의 사용자가 네이버 검색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디어의 사전적인 의미도 붕괴되고 있다. 42%의 사용자가 TV 프로그램을 TV가 아닌 Connected Device를 통해 소비하고 있다. TV는 더 이상 공중파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보여주는 가전제품이 아닌 것이다.

이런 트렌드의 변화를 반영한 대표적인 서비스가 Social TV 이다. TV와 Connected Device가 반응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또한, 잡지에 있는 QR를 통해 온라인에 있는 좀 더 상세한 정보를 볼 수도 있다. Hulu도 최근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관련한 포스팅을 하면 하단에 있는 입력창을 통해 페이스북에 의견을 남기게 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Screen 간의 연계 서비스가 2012년도에 활발하게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이런 N-Screen 서비스들은 다양한 자산을 가지고 있고 제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대형 기업들에게 유리한 것이다. Social TV의 경우도 프로그램 정보, 저작권 해결, 사용자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영세 사업자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국내 사용자들은 유선웹(51%)에 비해 무선(71%)에서 포탈 의존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바일로 급변하는 환경속에서도 새로운 플레이어가 탄생하지 못하고 대형 사업자들의 프레임에 갖혀 있다는 의미이다. 포탈 서비스들이 문제인 것은 아니지만 Start-Up 들만이 시도할 수 있는 새롭고 아이디어 넘치는 서비스가 탄생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토끼풀, TV 큐브 등과 같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시장 반응을 얻어내는게 실패하였다. GetGlue, Moso 등이 활발하게 서비스 되고 있고, 인투나우가 야후에게 2천만 달러~ 3천만 달러로 인수된 해외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Start-Up들이 고전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투자에 대해 소극적이고 관련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벤쳐캐피탈협회 자료에 의하면 2002년 3,014억원이었던 정보 통신 분야 신규 투자가 2010년에 2,956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투자 대상 업체수를 비교해 보면 더욱 명확하다. 2002년에는 395업체를 지원해주었으나 2010년에는 150업체 밖에 되지 않는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있다. 스마트폰의 혁명을 넘어서 N-Screen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변화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들이 나타나고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면서 성공 스토리를 만드는 것도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한 각종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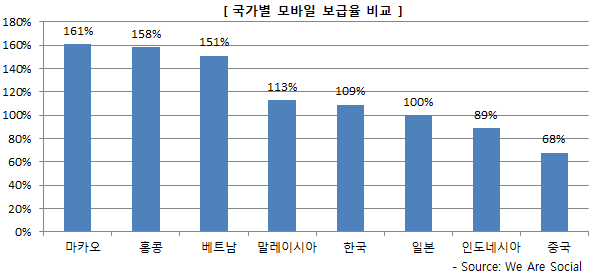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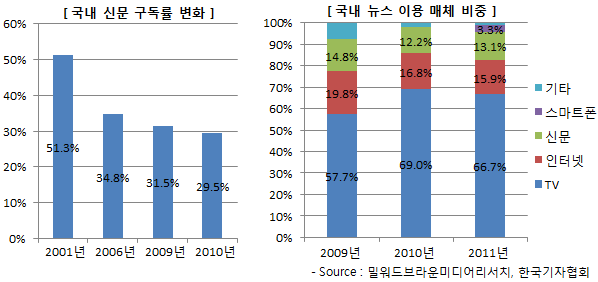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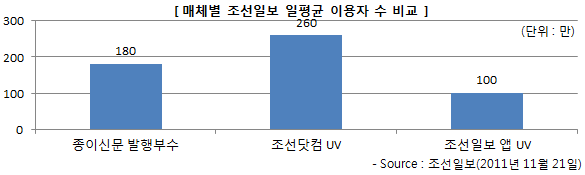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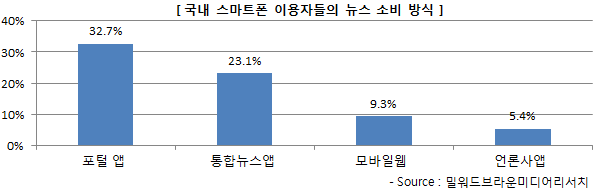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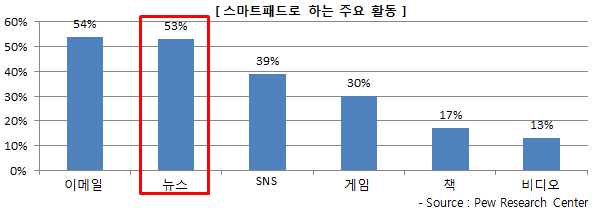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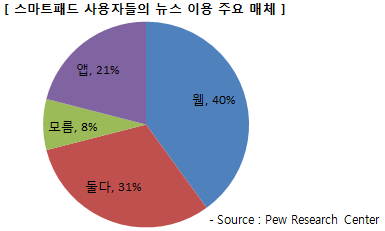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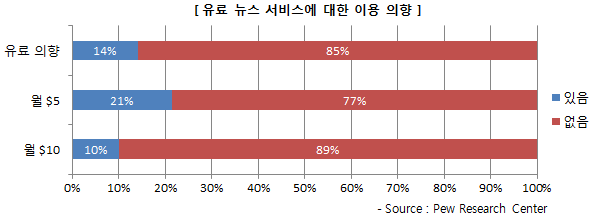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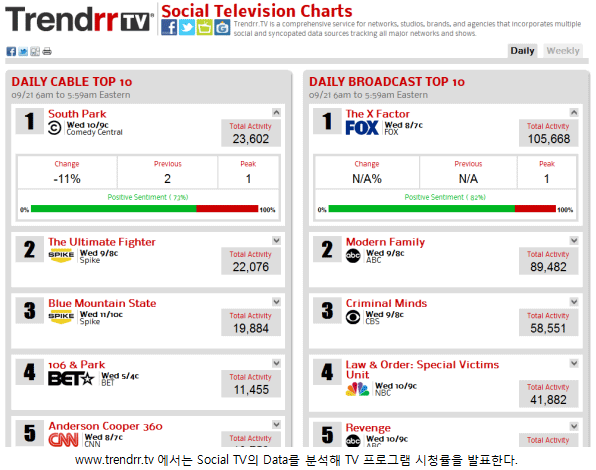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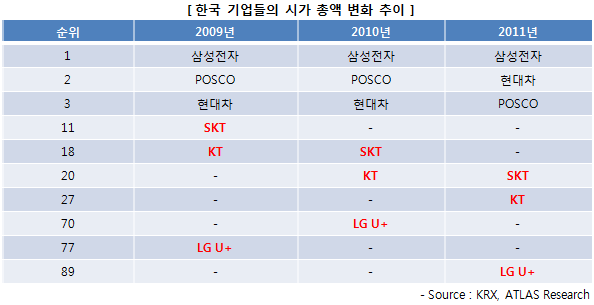





Comments List
인터엑션 Screen이나 소셜 연결은 생각하지 못한 내용이었는데..
단순히 n-screen으로 보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공부해봐야 겠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mass media와 online media가 상호 반응한다'와 'social TV'가 인상적입니다.
항상 좋은 내용을 올려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실패'까지는 아니어도 유저의 경험과 습관을 두어번 이상 붙잡아두는데는 확실히 '부족'했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사용자들이 적응하는 중' 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말씀에 눈이 다시한번 가네요. 즐건성탄&해피새해 되셔요~
스크린간 멀티태스킹으로 인한 인터랙션, 그로 인해 또다른 부가가치들을 창출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아지고 있죠.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
언제나 좋든글 감사합니다. 새로운 고민거리와 인사이트 많이 얻어갑니다. ^^
좋은글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새로운 시야를 주시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12년 소셜TV, N-Screen과 더불어 기업들의 BM 움직임이 좋은 성과로 나타났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BM의 성공은 또 다른 투자 그리고 더 좋은 서비스로 이어질 테니까요. 한가지 더 중요한 바램이 있다면.. 외국사례와 같이 그 과정에서 다양한 StartUp 업체들이 빛을 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퍼갈게요~
*저 또한 wow impact의 서비스를 마케팅하는 입장이라 공감가는 부분이 많네요^^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잘보고 갑니다.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